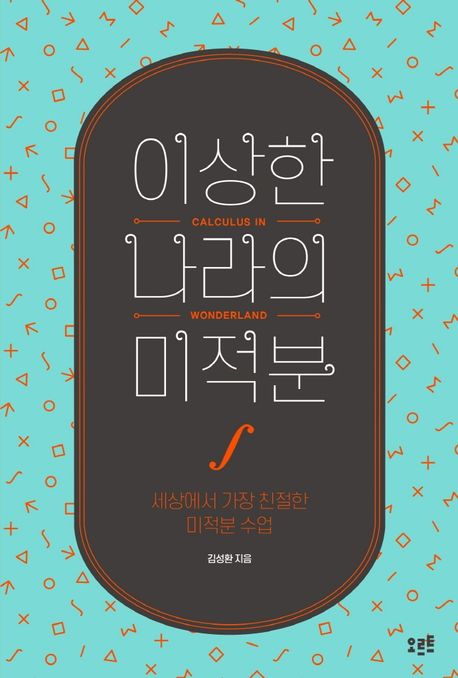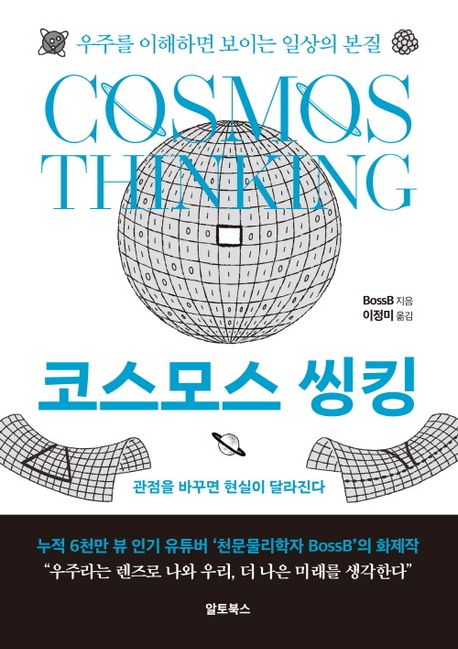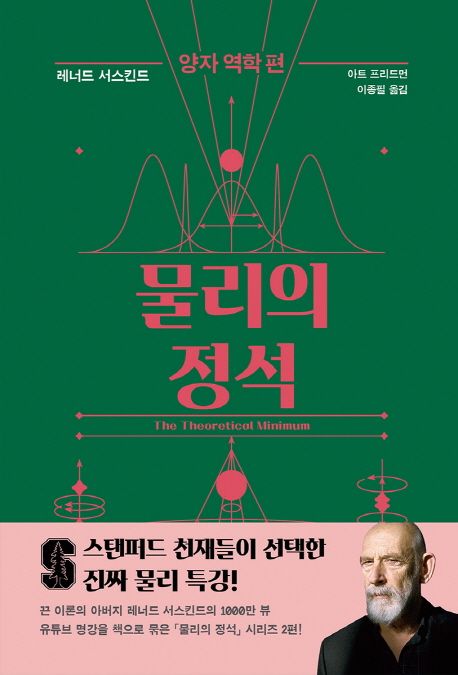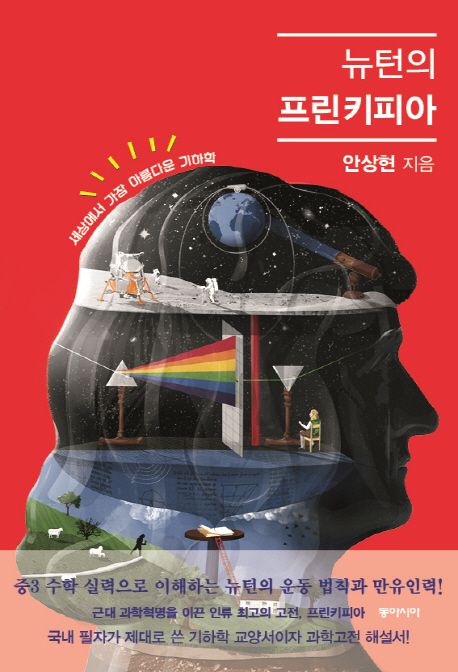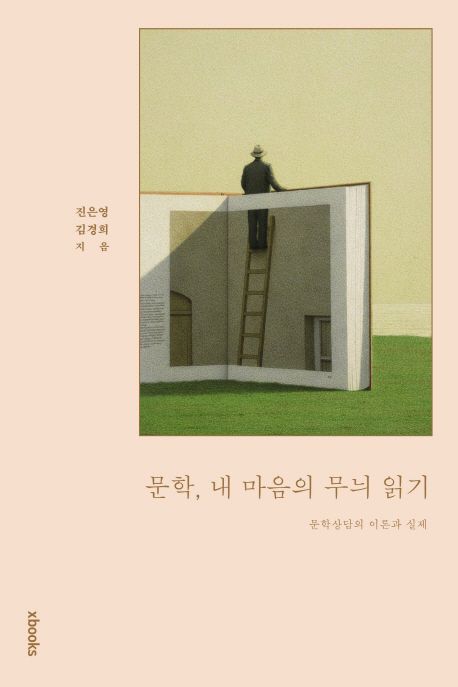주메뉴
도서
논어는 아름답다 : 논어에서 배우는 삶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힘 / 김경희, 진은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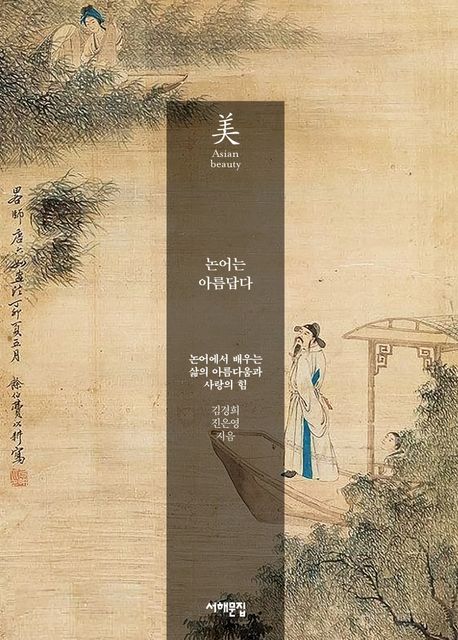
| 발행사항 | 파주 : 서해문집, 2024 |
|---|---|
| 형태사항 | 359 p. : 삽화(일부천연색) ; 19 cm |
| 총서사항 | 아시아의미 = Asian beauty ; 21 |
| 표준부호 | ISBN: 9791192988924 04150: \25000, ISBN: 9788974836672 (세트)듀이십진분류법: |
| 분류기호 | 한국십진분류법: 148.3, 181.112 23 |
| 마크보기 | MARC |
논어, 열린 배움의 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논어》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대 유가의 배움의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속에서 인간의 성장과 변화를 어떻게 도모했는지를 독자에게 생생히 전달한다.
유학은 역사가 긴 만큼 문제의식과 사유의 갈래가 다양하고, 《논어》와 공자의 행적에서 드러나는 초기 유학과 한나라 시대 이후 관변화되면서 확립된 제국의 유학은 차이가 크다. 또한 도가사상은 역사에서 실현된 유가의 이념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비판함으로써 그 견제자로서 동아시아 문화에 활력과 역동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초기 유가든 한나라 시대 이후의 유가든, 또는 유가든 도가든, 모두 현대의 자본주의적 삶을 지탱하는 기본 사유 방식과는 매우 거리가 멀고 해소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사유의 독특한 특징은 종종 '전근대성'이나 '반(反)근대성'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 단어로 소환되곤 한다.
여기서 반근대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장의 흐름을 저지하거나 그것에 역행하는 힘이다. 상품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오늘날처럼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의 논리가 공동체를 독식하고 개인의 삶을 붕괴한 적은 없었다. 긴 역사의 시간 동안 이를 저지하는 사유의 기제가 광범위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다. 유가의 또 다른 고전 《맹자》의 첫머리에서 맹자는 공동체의 담론에서 어떤 경우라도 이익이 아닌 인간다움으로서의 사랑과 정의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기보다 어떤 종류의 이익을 추구하든 그보다 우선하면서 그것을 규제하는 상위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가 지배적인 공동체의 구성원은 신 안에서, 예술 안에서, 때로는 배움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절을 살 수 있었다.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랑을 지켜 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존재를 상품이나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부속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상품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평가하며 더 나은 상품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간다. 공동체의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고, 넘쳐 나는 재화가 궁핍한 이를 향해 흘러가게 함으로써,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관념은 이제 많은 사람에게, 특히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위치에 있는 이에게, 고루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심지어 불공정한 발상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 다만 사랑이 유지되는 공동체가 시장 논리의 압력으로 찌부러져서 가족 단위로 축소되었을 뿐이다. 가족 안에서도 이러한 사랑을 확인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친밀한 관계조차 거래의 관점에서 보는 일이 잦아졌다.
소장정보
| 대출상태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반납예정일 | 자료실 | 선택 |
|---|
- 도서예약 : 대출중인 도서에 한하여 예약하는 서비스
- 상호대차 : 성북구 내 다른 도서관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 무인예약 : 지하철 등에서 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무인예약 신청자료는 예약, 상호대차, 무인예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려대역, 석계역의 경우 A4사이즈를 초과하는 너비의 단행본, 그림책, 특별판형본등의 도서는 투입이 불가하오니 대출 및 반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